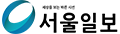탐매 (探梅)
누가 일렀던가,
난잎에 또르르
이슬방울 구르는 소리 들리어나는
첩첩깊은 산마루
괴괴한 절집 돌담
고즈녁한 햇살목에
아련한 향 품고
겁먹은 산토끼 빨간 눈망울 속
은둔으로 피어나는 고적한 매화라야만
진정한 봄매화라 불리울 수 있다지
언제 적,
바람 자는 깊은 심연에
살며시 심어놓은 매화목 물 올라
선혈빛 몽오리 움 터 숨겨진 거기
정녕 봄의 이름으로 네 얼굴 피어나
하냥 자리하느니
내 목숨 네게 주고픈
내 안에 너 있음에
영원도 찰나(刹那)로 여겨지어
이 밤 이리도 가슴 뛰누나

-시의 창
봄의 하루는 제법 길다. 하마 낮이 이만큼 길어졌구나 싶게, 햇살 바른 양지녘의 봄은 쪽마루에 긴 그림자를 늘어뜨리며 겨울과의 차별을 뽐내기 시작한다. 그렇게 봄이 살갗에 와닿는 느낌이 있기에, 미상불 잔소름 돋도록 이 환절의 계절맛이 싱그러운 거다.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부터 한반도의 봄은 시작된다. 어김없이 3월이면 새싹이 돋고,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봄’ 하면 떠오르는 매화가 이맘 때면 슬슬 채비를 갖춘다. 눈과 추위에 아랑곳없이 언 땅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는, 3월 즈음이면 어느새 곳곳에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방방곡곡 봄이 왔음을 알려 준다.
매화는 봄꽃 중 가장 먼저 꽃망울을 틔운다. 언뜻 보면 벚꽃과 닮았지만, 꽃술이 길고 꽃자루가 없이 가지에 바로 붙어서 피는 걸 보고 구분하면 된다. 추운 날씨에 꽃을 피우는 것이 절개가 곧은 것으로 비유되는 대표적인 화목이다. 춘풍에 하르르 떨어지는 매화꽃잎을 만끽하는 봄꽃여행은 어떤 여행보다도 정겹고 황홀한 추억을 선사해준다. 게다가 시절이 봄인지라 들뜬 마음을 오히려 달래주고, 아름답게 승화시켜주는 매력까지 지니고 있어, 여행 중에 느끼는 매화의 풍류는 봄의 흥취 중에서도 단연 압권이다.
매화도 매화지만 다른 봄의 꽃들도 필자의 심사를 동하게 만들기는 매양 한 가지다. 도무지 안달이 나서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을 수가 없던 지난 주말, 다시 방랑벽이 도진 필자는 봄이라는 손님을 마중할 요량으로 서둘러 입성을 챙기고, 봄기운이 흠씬거리는 산나들이에 나섰다.
치악산 ‘영원사’ 가는 길, 미처 해동도 되지 않은 밭에서 만난, 콕콕 호미로 해토머리 흙을 찍고 계신 할머니는 일흔 후반은 족히 돼 보였다. 올해 처음 나오신 밭일이란다. “보름밥 지어 먹었으니 인제 일해야지. 봄이 그저 오는감? 이리 몸을 놀려야 오는 것이지.” 하지감자 씨알을 박아 넣을 고랑을 고르는 몸놀림이 평생을 다진 품으로 옹골졌다. 말로는 지겹다 하셨지만, 새 계절을 맞는 기꺼움이 그니의 고부린 몸에 꽉 차 있었다. 호미질에 뒤집힌 시꺼먼 흙에서 하얀 훈김이 피어 올랐다. 흙더미엔 파란 봄까치꽃이 앉아 있었다.
굽이길을 돌아 졸졸 계곡물을 거슬러 이윽고 뒷덜미에 잔잔히 땀을 배어올리며 다다른 절, 봄은 어느덧 산을 빙 둘러 자리한 천년고찰의 분주함으로 들떠 오른다. 석 달 ‘불식촌음(不息寸陰)’의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목련도 매화도 대부분은 아직 망울에 갇혀 딴딴했지만, 묵은 절집의 풍경은 스님들의 말간 얼굴로, 철이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절집 뒷 켠의 유서 깊은 토방에서 동안거를 지내고 나오는 스님에게 불쑥, 공부가 어떠했느냐고 물었다. 뱉어놓고 보니 밑도 끝도 없이 무례한 말이다. 빙충맞은 표정을 물끄러미 보던 스님은 면박을 주는 대신 “끝이 없다”는 현답을 들려줬다. 잿빛 바랑을 짊어 멘 걸음걸이만큼 그의 목소리가 표표했다.
울에 빙 둘러쳐진 담장사이로 노란 개나리꽃망울이 듬성였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올해 들어 처음 보는 산과 들의 샛노란 빛깔. 한참을 봄맞이꽃과 함께 손잡고 볕바라기를 하다가 돌계단에 발 디뎌 경내의 뜰안으로 들어섰다. 아궁이에 군불이 타고 있어 다가갔더니 불은 화라락 타올랐다가 곧 꺼졌다. 하지만 여운이 깊었다. 뱃구레 속이 오래 뜨끈했다. 그건 어머니산, 보은의 산 치악산 자락에서 한나절 받은 이른 봄볕의 기운임이 분명했다.
이제 다시 시작한 올 봄의 삶, 이제부터는 과연 어떤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살아갈까? 얼마나 고운 색깔로, 어떻게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이야기를 써내려갈까? 산에서 생각하고, 산에서 결심하고, 산에서 다짐을 한다.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와 일상으로 되돈다. 다음, 산에서의 약속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며 삶을 조심스레 펼친다. 행여 부족할세라 연이어 채근한다. 늘 반성과 다짐을 수반하면서. 그게 연속의 삶이다.
화려하고 화사한 젊음을 잃었다고 너무 한탄하지 말자. 어쩌면 지금의 향기가 더 아름답고 더 그윽할지도 모른다. 묵향처럼, 난향처럼 가슴 속까지 깊이 배어드는 그 향기가 더 좋을 수도 있다. 피었던 꽃은 머지않아 시들어도, 세월의 주름살 따라 흐르는 경륜과 식견의 향기는 마르지 않고 항상 온화한 것, 온 누리를 가득 채우고 남아 가슴을 흥건히 적셔오는 스스로의 향기에 취해본다.
그 향은 난향이 되기도 하며, 그러다가 국향인가 하면, 매향처럼 향긋하기도 하여 어느새 사군자 모두가 되어진다. 인격과 후덕함이 쌓여서 빚어내는 그런 향기 말이다.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다 아우려 헤아리는 연륜의 사람은, 언제든지 사랑하고 또 얼마든지 사랑받을 그런 멋을 갖춘 사람이다. 매화 빛깔 붉은 가슴 펼치면 어느새 눈 속에서도 바로 새 꽃을 피워낼 그런 사람이다.
이제 자신의 인생과 기품에 따라 자기만의 향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꾸어가야 할 때이다. 하늘의 뜻을 알고 귀가 순리대로 들려야 할 때이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희생으로 베풀고, 곱디 고운 심성과 아량으로 살아온 발자취가 있었기에 나이 들어 이토록 아름다운 자태로 빚어내고 있으려니, 절대로 지난 날 삶을 아쉬워하지 말자. 주름살이 깊어진 만큼 우리의 가슴 속도 깊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대신 우리의 사랑은 더 부드럽고, 향기는 더욱 더 짙어져가고 있음이렷다.
있는 그대로의 참 모습이 어느 화장품, 어느 향수보다 더 곱고 더 향긋하다. 느낌으로 전해오는 향기를 젊은 사람들은 존경하고 사랑할 거다. 금쪽 같은 하루, 오늘도 우리가 보람있게 살아야 할 이유이다. 우리에게 다시 올 봄이 몇 번이나 남겨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냥 이 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