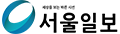( 서울일보 / 도한우 기자)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망할 뻔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 퀘도로 되돌릴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많으나 그직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요즘 후보들간 오가는 말들을 보면 2002년 대선 때로 돌아간 것 같다.처음부터 상대방 흠집내기와 책임 덮어씌우기, 네거티브 공격에 후보별 저격수까지 등장하는 게 마치 데자뷰 같다. 이러다‘나바론팀’이 또 등장하는 건 아닌지 기자는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한다.
국민의힘 경선버스에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연일 내부 경쟁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5일 SNS에 윤 전 총장에게 “기자들 핑계나 대고”, 최 전 감사원장에게는 “국정이 벼락치기냐”, “당X무시하며 패거리정치”, “파리들이 다 당 망쳐”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쏱아냈다.
이는 윤 전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의 메시지 중에 지금까지 자유, 시장, 탈원전 말고 다른 어떤 미래 비전을 아직까지 못 보여준 까닭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는 왜 정권을 빼았겼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권 빼앗기기 전에 내세웠던 가치들만 내세우고 있다.
그래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보수 진영은 인기가 없다. 지난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자본주의 찬양만 해서는 답이 나올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직업을 가지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시장에 맡기면 되는가? 지금까지 시장에 맡겨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더 잘살게 되려면 결국 소득의 증가속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 빨라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예산을 집행하고, 법을 만드는 데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떤 법을 만들고 폐지하며, 예산은 지금 집행하는 것과 달리 어떤 곳에 사용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만 해도 접근 방식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여 새집 공급을 늘릴 것인지, 금리를 인상하여 통화량을 줄일 것인지, 지방을 발전시켜 인구를 분산시킬 것인지, 주택 소유를 제한하여 수요를 감소시킬 것인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할 것인지, 온갖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이야기해야 한다.
탈원전 문제도 마냥 원전이 안전하다고 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우리보다 먼저 원전을 만든 원전 선진국인 미국, 소련, 일본에서 모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안전을 도모할 것인지, 핵폐기물은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를 더 상세하게 말해야 하는데, 윤석열 주변의 원전 전문가들은 그런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다.
주변에 전문가들 말은 들어야겠지만, 결국 본인이 현명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 의견은 대부분 여러 가지로 나뉜다. 결국 마지막 결정과 책임은 의사결정권자에게 부여된다. 대통령 선거는 바로 그 의사결정권자를 역시 비전문가인 국민들이 선출하는 제도이다. 전문가에게 맡길 생각을 하지 말고 본인의 안목을 키울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우군인 안철수 대표와 싸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주관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대선후보들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쏴대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창출 실패해 대선후보 욕하고 당대표 욕해 봐야 소용없다. 윤석열,최재형 두 후보가 보여준 그간의 행적은 불행히도 잘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도 만들어야 한다. 기자가 바라는 것은 정치적‘싸움꾼’도 필요하겠지만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바른 정책을 만드는‘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