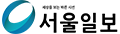(정종암/본지 주필·평론가) 작금의 대한민국에는 늦가을 낙엽처럼 시(詩)가 소각장으로 가는 형국이다. 시인도 많고, 파지수집상으로 가야할 많은 시가 나부끼나 그릇된 유희만 있을 뿐, 옛 문인의 반열에 둘 문인은 없다. 이에 중국의 고대 시(古代 詩)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 한 편에 취한다.
이는 봄 어느 날 밤, 이백(李白)이 도리원에서 잔치 중에 읊은 시서(詩序)이다. 그는 당 현종 대 사람이다. 그러면 동양의 절세미인으로 불리는 현종의 후궁이자 며느리였던 양귀비(楊貴妃)가 등장하겠다.
양귀비의 세도가 대단했다. 그러한 그녀에게 현종 앞에서 시를 읊을 때는, 이백은 벼루와 붓을 들게 하는 배짱까지 있었다.
달빛 아래 술에 취하던 이백의 이 시에 대해, 원문에다 괄호로 하여 음을 달고는 해설과 함께 비평함에, 14세기 전의 그를 소환하여 힘든 이 세상에서 한번 놀아보는 것도 삶의 엔돌핀이 솟겠다.
夫天地者 萬物之逆旅/ 光陰者 百代之過客(부천지자 만물지역려 광음자 백대지과객)/ 而浮生若夢 爲歡幾何/ 古人秉燭夜遊 良有以也(이부생약몽 위환기하 고인병촉야유 양유이야)// 況陽春召我以煙景 大塊假我以文章(황양춘소아이연경 대괴가아이문장)// 會桃李之芳園 序天倫之樂事 群季俊秀 皆爲蕙連 吾人詠歌 獨慙康樂(회도리지방원 서천륜지락사 군계준수 개위혜련 오인영가 독참강락)// 幽賞未已 高談轉淸(유상미이 고담전청)/ 開瓊筵以坐花 飛羽觴而醉月 不有佳作 何伸雅懷(개경연이좌화 비우상이취월 불유가작 하신아회)/ 如詩不成 罰依金谷酒數(여시불성 벌의금곡주수)
“천지라는 것은 만물이 잠시 쉬어가는 나그네 집(여관)이고,/ 세월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나가는 길손이라./ 우리네 인생, 덧없고 짧음이 꿈과 같으니,/ 즐긴다한들 그 얼마이겠는가.// 옛사람이 촛불을 들고 밤에도 노닌 것은 참으로 까닭이 있는 일이다./ 더구나 따스한 봄날이 백가지 꽃과 아지랑이로 나를 부르고, 천지는 나에게 글재주를 빌려 주었음에랴!// 복사꽃과 오얏꽃이 핀 아름다운 동산에 형제들이 모여 천륜의 즐거운 일을 펴니,/ 여러 아우들은 글 솜씨가 빼어나 혜련(중국 남북조시대 송나라 사강락의 아우였던 시인)에 버금가는 데, 내가 읊은 시만이 강락(중국 남북조 시대 송나라 산수시인인 사강락)에게 부끄러울 뿐이다.// 그윽한 봄 경치에 대한 감상이 그치지 않음에, 고아한 담론이 더욱 맑아진다./ 아름다운 옥(玉)자리를 펴 꽃 앞에 앉아, 깃털모양의 술잔(羽觴)을 날려 달 아래 취하니,/ 이럴 때 좋은 시를 짓지 않는다면 어찌 고아한 회포를 펴겠는가./ 만약 시를 짓지 못하면 금곡의 고사(故事)처럼 벌주(罰酒)를 마시게 하리라.”
위 시는 중국 성당기(盛唐期), 이백(701∼762)이 33세 때 읊었다.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로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칭해지는 중국 최대의 시인이며, 시선(詩仙)이라 불린다. 1,100여 편이 현존한다.
위에서 언급한 서(序)란 연회와 송별회석상에서 읊은 시를 모아 시집(詩集)을 만들고 붙인 서문(序文)이다. 달리말해 사물의 차제(次第)를 순서를 세워서 서술하는 글을 일컫는다.
고로 이 시는 어느 봄날 밤, 형제와 친족들과 함께 복숭아와 오얏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연회를 열고 각자 시를 읊으며 노닐 적에, 그 시편 앞에 그 때의 감상과 일의 차제를 편 문장이다.
짧고도 짧은 인생은 무릇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찌, 드넓은 세상도 잠깐 머물다 쉬어가는 여관에 지나지 않으리. 억만 겁의 시간 속 찰나 중의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네 삶은 순차적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승을 떠난다.
예외 없이 나그네처럼 이승을 떠나가는 게 무릇 인간들의 삶이어라. 이러함은 이 지구상에 잠깐 여행객으로 와서는 함께 떠나는 동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뭇 군상들은 재물을 탐하고 증오와 시기·질투로, 그 짧은 여행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기에 일찍이 '초로인생'이라고도 했다.
부귀영화를 차지하려고 닭싸움하듯 하는 아귀다툼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동 인간임에도 '슈퍼-갑' 노릇에 찌든 대한민국 고등사기꾼집단인 정치꾼들도 난장판을 벌리다가 끝내는 간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시황제(始皇帝)도 불로초를 구하려는 우둔함을 멀리한 채, 겨우 쉰을 채우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갔다.
사랑하는 남녀가 이별하듯이 나도 가고, 네도 가고, 그도 가는 게 삶일지라도 이백은 동양 최고의 시인으로 현존한다. 문필가는 이승에 재산은 남기지 못해도 족적만은 남긴다. 고래로 탐욕에 세속적 부와 함께 문을 토함은 야누스적 삶이다.
그래서 본 비평가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는 탐구와 함께 졸필을 굴리는지 모른다.
밝은 달빛이 꽃잎 사이로 아른거림에 취하고 싶다. 모든 게 고도화된 이 세상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기에 형제와 친인척, 지인들이 모여 이 시간이 오려나. 이백과 같이 시를 토하면, 유한한 인생이 무상하지 않고 영원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에 있어 지식이든 세속적 부든 이 사회에 던지면서 가고는, 영원한 삶이면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