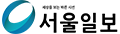(현진 기자) “뛰 부 트하바이에 아벡 무와?”(Tu veux travailler avec moi?: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2014년, 샤넬(Chanel)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트 디렉터 크리스텔 코셰(Christelle Kocher)는 서른 초반의 동양 디자이너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샤넬의 선택을 받은 이 동양 디자이너는 패션 명문 ‘파리의상조합학교’ 출신의 조아라.
샤넬은 파리 패션계의 걸출한 스타 안 발레리 아쉬(Anne Valérie Hash)와 8년간 같이 일한 조아라의 실력과 평판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샤넬 공방 르마리에(Mason Lemarie)를 맡고 있는 크리스텔 코셰의 눈은 정확했다.
조아라와의 협업 결과는 LVMH(루이비통모엣헤네시) 프라이즈 ‘올해의 디자이너’ 수상으로 이어졌다. 수상 당사자는 코셰지만, 패션 작업은 개인의 산물이 아니기에 팀 파워는 그래서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후 프랑스 패션업계는 “조아라와 코셰의 ‘시너지 효과’가 파리에서 주목할 만한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파리에서 15년 간 활동한 조아라(37, 프랑스 영주권자) 디자이너는 지난해 완전 귀국, 아크(ARCH)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했다.
조아라라는 이름은 아직 한국에서는 낯설지만 파리에서는 이미 실력파로 인정받았던 그다. 그런 그녀는 지금 서울에서 ‘빅 스케치’를 구상 중이다. ‘작은 옷감’이 아닌 ‘한국패션의 미래’라는 큰 그림이다. 우리가 조아라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공방에서 만난 스톡맨(stockman)과 주키(JUKI) 재봉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크(ARCH)의 공방.
조아라 디자이너의 공방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아담했다. “조만간 개인 컬렉션을 계획하고 있다”는 조아라 디자이너는 손가락 10뼘 되는 크기의 긴 테이블에서 작업 중이었다. 조각조각난 크고 작은 천들, 다양한 작업도구들, 유명 디자이너들의 책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명품 마네킹이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에서 갖고 온 스톡맨(stockman)이라는 인체모형 보디에요. 디자이너들에겐 최고의 작업 도구죠.” 스톡맨엔 세련된 블랙 드레스가 입혀져 있었다. “네오플랜이라는 소재로 만든 작품인데, 스톡맨으로 입체재단 작업을 하면 이 드레스처럼 핏(fit)이 잘 살아납니다.”
스톡맨 외에 다른 2개의 마네킹도 옷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기억(ㄱ)자로 배치된 두 개의 행거에는 그동안 작업한 여성복과 아동복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곧 세상에 빛을 보게 될 조아라 디자이너의 ‘프렌치적 아이템들’이다.
눈을 잠시 돌렸다. 조 디자이너의 손때가 묻은 공업용 주키(JUKI) 미싱기가 눈에 들어왔다. 15년 패션유학의 경험을 말해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칼 라거펠트-이브생 로랑을 배출한 파리의상조합학교
강원도 강릉 출신인 조 디자이너는 고등학교(계원예고)만 졸업한 채 파리로 떠났다고 한다. 2002년의 일이다.
조 디자이너는 자신의 꿈을 키워 줄 학교로 ‘파리의상조합학교’(Ecole de la Chambre Syndicale de la Couture Parisienne)를 선택했다. 1927년 세워진 이 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전통있는 패션 스쿨의 하나로 꼽힌다. 4년 과정으로 철저하게 오뜨 쿠띄르(Haute couture: 고급 맞춤복) 기법을 전수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패션계의 카이저’(황제) 칼 라거펠트, ‘패션의 전설’ 이브 생 로랑, 일본 유명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가 이 학교 출신들이다. 이 가운데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브랜드는 한국팬층이 두껍다.
조 디자이너는 “파리의상조합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성과 기술력 그리고 세 선배 등 이 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행보가 나한테 큰 영향을 줬다”고 했다.
“커리큘럼 중에서 우리 학교가 가장 신경 써서 가르치는 기법은 ‘입체재단’입니다. 평평한 종이나 천에 자를 대고 옷본을 그리는 평면 재단과 달리, 입체재단은 보디(인체모형)에 직접 얇은 천을 대고 모양을 잘라내서 옷본을 만드는 기법이죠.”
학교를 졸업한 조 디자이너의 주된 무대는 ‘파리 패션 위크’. 겐조(Kenzo), 프랑크 소르비에(Frank Sorbier), 안 발레리 아쉬(Anne Valérie Hash), 크리스텔 코셰(Christelle Kocher) 등의 테크니션
브랜드들을 거치면서 프레타 포르테(기성복)와 오뜨 쿠띄르(고급 맞춤복)를 섭렵했다.
이중 안 발레리 아쉬의 키즈 라인(브랜드명: 안 발레리 아쉬 마드모아젤)의 프레타 포르테 총괄 디렉터를 맡는 등 안 발레리 아쉬와는 8년간 같이 작업했다.
그런 안 발레리 아쉬는 파리의상조합학교 후배인 조아라에게 “너를 통해 아동복의 미래를 보았다”고까지 높게 평가했다.
조 디자이너는 2004년 ‘디암 프라이즈 콩쿠르’ 파이널 리스트와 2005년 ‘국제 신인 디자이너 콩쿠르’ 파이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그녀는 “당시엔 브랜드에 소속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크게 상 욕심을 내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고 욕심이 없는 건 아니다. 그는 “이제는 개인 브랜드를 론칭했으니 코셰처럼 ‘LVMH 프라이즈’ 같은 상을 노려볼 만하지 않겠느냐(웃음)”고 말했다.

◆15년 파리 활동 접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조 디자이너는 한국으로 오기 전 샤넬 디렉터인 크리스텔 코셰(Christelle Kocher)와 작업했다. 코셰는 2014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 ‘코셰’(Koché)를 론칭하면서 전 세계 패션 스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금은 샤넬보다 코셰 브랜드의 약진이 무섭다고 한다.
“코셰와 같이 했던 작업은 그동안 샤넬이 해온 모든 전통적인 방식을 활용하되, 그것을 어떻게 재조합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코셰는 옷에 어떤 포인트를 넣었을 때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지를 잘 아는 디자이너였어요.”
당시 파리엔 “코셰에게는 조아라가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고 한다. 코셰에게 조아라 디자이너의 존재감은 컸다. 그런 코셰는 조 디자이너가 오랫동안 옆에 있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조아라 디자이너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다. 그는 지난해 안정된 자리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한국패션의 미래 같은 걸 구상해 보고 싶었어요. 많이 아쉬웠던지 코셰가 저한테 샤넬 디렉터 자리를 제안했어요. 샤넬 스튜디오에서도 콜을 받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어요. 코셰는 올해 스포츠브랜드 나이키와 협업하면서 중국, 일본 등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셰의 나이키 작품을 봤더니 제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다시 협업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자신의 영어 이름 따서 아크(ARCH) 브랜드 론칭
조 디자이너는 귀국 후 자신의 영어 이름(ARA CHO) 이니셜을 따서 아크(ARCH)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아크에는 건축을 뜻하는 영어 아키텍쳐(ARCHitecture)의 의미도 있다고 한다.
“패션디자이너에게는 옷감 소재 선택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뭘 담느냐 하는거죠. 저는 ‘기품 있으면서도 편안한, 그리고 여성성’을 추구합니다. 건축이 건물을 쌓아 올리듯, 아크는 ▲기품 ▲편안함 ▲여성성을 패션예술에 입히는 것이죠.”
조 디자이너는 ‘프랑스 정통 오뜨 쿠띄르’를 지향한다. 15년 파리 유학의 결정체. 그렇다고 마냥 프랑스 스타일만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작품에서 프렌치적 소스를 내세우겠지만, 거기에 코리아 브랜드라는 걸 어떻게 살려야 할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브랜드를 제 능력선에서 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큰 숙제 중의 하나죠.”
조 디자이너의 꿈은 옷을 만드는데 만 머물러 있지 않다. “오드리 헵번이 그랬던 것처럼, 패션을 통한 기부 활동이 제가 꿈꾸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디어가 달릴 때는 ‘검색’보다는 ‘사색’을 통해 답을 찾는다는 조아라 디자이너. 그와 몇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내린 결론은 그녀의 브랜드 아크(ARCH)가 불꽃을 튀기며 솟아 오를 날이 머지않았구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