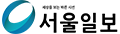가버린 시절
고목에 등 기대어 눈감아보라
나무가 과거로 너 짭짤하게 안내할 거다
아무도 묻지 않았기에
흘러간 시간에 대해 알 수 없었고
흐르기만 할 뿐 되돌릴 수는 없다지만
처마밑 빛 바랜 연등처럼
달의 보이지 않는 저 편 꿈꾸고있는 회상
어릴 적 시골집엔
겨우내 몸 뒤척여 말라비틀어지던
뒬안 응달 시래기다발 있었지,
쪼글쪼글 푸석하고 볼품없는 흑갈색 푸성귀
곰삭은 흙벽 매어달려
바람불면 파르르 그 마른 잎 바스락대는
아련함으로 여태 자라났거늘
지겹도록 살아오면서 넌 과연
남에게 시래기죽 한 사발만큼의 역할이라도
한 적은 있는 건가?
빛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세월 흐름 속에서
높이로 깊이로 넓이로 뻗어나가다가
놀라운 뿌리 형성하도록 정신 못차리는
어중이떠중이들과 뒤섞여
염통 쫄깃거리는 애욕의 전선에서
눈썹 휘날리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휘황찬란 가버린 끓는 피 시절들이여!

시의 창
사람이 요람에서 처음 태어나서부터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를 한 평생이라고 표현한다. 그 한 평생 동안 장수와 단명을 구분하되, 길고 짧음을 막론하고 정말 많은 일을 경험한다. 그 경험에 대처하고 적응하며 견뎌내는 과정을 우리는 삶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삶이란 것이 각각 모양새가 달라서, 이리 사는 것이 최상이며 최선의 길이라고 확실한 방도나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승자와 패자라는 호칭을 섣불리 인생에 붙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하물며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단어를 남들의 삶에 갖다 붙이는 것은 더욱 더 어불성설이다.
그냥 남들보다 좀 더 편하고 쉽게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난히 힘들게 지지리 궁상으로 버거운 세상사에 시달리다 가는 사람들도 허다하니, 따지고 보면 세상은 요지경이요, 세상 모습은 천태만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요는 누구나 한 번 사는 세상인 건 분명하지만, 자의나 타의 여부를 깨닫지도 못하는 새 허망한 삶은 끝나버리고, 그냥 순간적으로 현재를 보내다가 엉겁결에 과거를 만들어버리니, 결국은 모든 세상사를 찰나요 촌음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힘 없는 인간의 숙명인 셈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고래로부터 이어지는 만고의 진리다.
그런데 각자의 삶의 색깔이나 과정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 예컨대 한 가지는 누구나 동일한 것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실은 바로, 잘났든 못났든 자기 삶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라는 점이다.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 본인을 중심으로 자기의 세상은 돌아간다. 스스로가 생각하는대로 세상사가 펼쳐지고 늘어지며 이어진다.
그러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삶에 대한 소유권과 애착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집과 독선과 편견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이며, 가장 올바른 판단이 자신의 기준이라는 고집스러움이 모든 사람들의 밑바탕에 숨어있다.
잘 된 일은 자신의 선택과 생각이 옳았기 때문이며, 잘못 되어진 일은 남의 탓이나, 세상 탓, 시절 탓 등을 하면서 외부에 그 책임과 핑계를 돌린다. 이것이 나약한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비겁함이며, 치졸하지만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그나마 그것을 조금이라도 탈피해보고자 우리는 열심히 학습과 수업을 하며, 체험과 후회와 반성으로 늘 거듭나고자 노력한다.
“내 최대 약점은 사람들과 맞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TV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많은 책을 쓰고, 심리치료사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철저히 짓밟도록 내버려둔다. 간신히 용기를 내어 무슨 말이라도 하려면 며칠씩 꾸물거리며 고민해야 한다.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맞서느니 차라리 거리로 뛰쳐나가 트럭에 부딪치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자서전에서 밝힌 말이다. 이처럼 의외로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달변가인 방송 진행자가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릴 정도라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할까? 우리의 삶은 어찌보면 치열한 전투와 생존경쟁의 다툼이 그 본질일지도 모른다.
어차피 세상사란 상처를 입으면서, 그 상처들을 쌓아 이루어낸 결과와 보람으로 빚어내는 작품이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할큄 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를 받은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 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의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하나 없을 것 같지?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 독수리들에게 할퀸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자꾸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이쯤에서 조심스럽게 오늘의 제언을 해보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가지 계단을 부단하게 걸어 올라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늘 정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주지해야 할 계단은 바로 ‘관심의 계단’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는 한 점 먼지에게 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부여해야 한다.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하찮은 요소까지도 지대한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의 계단으로 오르는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해의 나무에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오해의 잡초에는 증오의 가시가 돋는다.
두 번째는 ‘이해의 계단’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도 내면적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면 아름답게 해석될 수 있는 법이다. 걸레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외형적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면 비천하기 그지없지만, 내면적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면 숭고하기 그지없다. 걸레는 다른 사물에 묻어있는 더러움을 닦아내기 위해 자신의 살을 헐어야 한다. 이해란 당신 자신이 걸레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음이 ‘존중의 계단’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사랑이 이어지지 않고,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사랑이 깊어지지 않으면 당신이 소망하고 있는 행복은 영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계단’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신이 인간을 빈 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보낸 이유는, 누구나 사랑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신이 인간을 빈 손으로 저 세상에 데려가는 이유는, 한 평생 얻어낸 그 많은 것들 중 천국으로 가지고 갈 만한 것도 오직 사랑 밖에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신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세상 만물이 서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마침내 가슴에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을 위한 하염없는 발걸음을 딛은 채 달리고 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좀더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듯이 말이다.
어느 시점에 도달하고 얼마만큼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따지기 보다는, 얼마나 많은 자신의 삶에 자신이 헌신했는지가 더 기쁨을 안겨주기 마련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도 없지만, 문득 하나 씩 만들어가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따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는 남과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베풀고 할 수 있는 작은 마음이 있어서 더 멋진 삶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다.
나날이 신록이 진녹색으로 변해가는 5월의 하순, 한 여름을 코앞에 두고 목하 여름을 살아낼 채비에 여념이 없는 대자연의 분주한 일상처럼, 계절 변화에 적응하여 빛과 색을 바꿔 입으면서 새 삶을 살아가는 순리처럼, 우리네 세상 살아가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사랑과 평화의 강으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흘러드는 아름다운 저 물길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