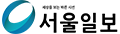199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의 과열 취재로 정 회장의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무질서한 취재 현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언론계에서 포토라인 제정 논의에 들어갔고, 1994년 12월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한다”는 ‘포토라인 운영 선포문’을 발표했으며, 이는 2006년 ‘포토라인 시행 준칙’으로 구체화됐다.
포토라인이 정착된 이후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 국회의원 등 주요 사건 관련자들이 어김없이 포토라인에 서다 보니 ‘한국의 포토라인 앞에는 성역이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난 1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출두할 당시 검찰 청사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패싱하면서, 과연 포토라인을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존폐 논의가 뜨거운 실정이다.
포토라인은 피의자가 소환될 때 잠시 멈춰 서도록 수사기관 출입구 앞 바닥에 테이프로 만들어 놓은 선으로, 피의자가 여기에 서면 기자들은 사진을 찍고 입장을 물어오곤 했다.
그런데, 검찰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찬성론의 가장 큰 논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공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면 국민은 검찰이 누구를 조사하는지 알 길이 없어 결국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밀실 수사가 많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고 본다.
또한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힘없는 서민들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이런 분위기가 검찰 수사를 감시하는 것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반대론의 주요 논거를 보면, 우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하물며 피고인도 아닌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혐의 사실을 일부라도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은 사실상 죄인이 되고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아도 명예가 회복되지 않으며, 포토라인에 서고 안 서고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선별해 결정하기에 피의자나 참고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선 사건 관련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예가 거의 없다. 미국·독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 일본 경제계 거물인 닛산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관련 사진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위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시하는 찬성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반대론 모두 나름의 논거가 있기에 포토라인 존폐 여부에 대한 결론을 쉽게 내리기는 어렵고 향후 검찰, 언론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진지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포토라인이 비록 법적 근거가 없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고, 다만 피의자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세분화,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자신의 억울함이나 진실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울러 수사 단계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취재와 검찰 수사에 대한 감시는 가급적 적법한 수사공보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언론의 취재 관행도 수사 단계에서 기소 이후 재판 단계로 취재의 중심이 옮겨가야 된다고 본다.
포토라인에는 죄가 없다고 본다. 포토라인 위에 서는 피의자의 이미지 연출 욕망, 피의자를 언론 앞에 세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검찰의 욕망, 특종 보도를 노리는 언론의 욕망, 그리고 누군가의 추락을 즐기려는 대중의 욕망 때문에 포토라인이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진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