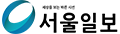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이 맞긴 맞나. 가진 자들만의 천국 대한민국이 맞긴 맞는 모양이다.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는 고시생은 없었다. 차상위계층이 이리저리 치인 삶의 막장드라마 끝에 중장년층의 탈출은 7명의 주검으로 변했다.
상해를 입은 13명은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의료보험이 연체돼도 재산이 없기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징수조차 못하는 1인가구가 많다. 87민주항쟁과 탄핵을 요하는 촛불시위에도 나서 싸운 은전이 이것인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자의 절규가 복지사각지대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공무원만이 살 길이다”는 그릇된 최면술에 걸린 청년들이 운집하는 고시촌인 신림동이나 노량진이 아닌, 대통령이 사는 종로에 간신히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갈 길 잃은 중장년층, 심지어 여생을 즐길 노인까지 살고 있었다. 최악의 주거에서 살다가 만장조차 없는 이승의 길을 떠남에 지각 있는 국민들의 애도만 있을 뿐, 힘센 자들의 행렬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주검을 배웅할 은은한 장송곡은 이승이 아닌 저승의 강인 비탄의 강 아케론(Acheron)에서 카론(Charon) 영감이 불러줄려나.
쪽방, 이곳에서 나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부여잡았지만 한계였다. 경제대국이란 이름이 아깝다. 10년 전의 시를 한 번 음미해보자.
“눈이 내린다/ 미로 같은 골목길/ 쪽방촌에/ 내리는 눈은 더 세차다// 춥다 추워/ 궁궐 같은 건너편/ 휘황찬란한 불빛을 바라보며/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으로 사들인/ 소주잔을 들이키며/ 이 세상을 한탄하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알량한 정부보조금에/ 의지하던 주검은/ 이 춥고도 추운 겨울에/ 누더기 같은 보자기에/ 싸인 채 무겁고도 무거운/ 삶의 무게를 던지고// 저 세상/ 멀고도 먼 곳/ 누구도 알 수 없는/ 황천길로 떠난다/ 저 주검이 떠난 빈자리도/ 곧바로 채워지는 쪽방촌의/ 밤은 깊어간다(쪽방촌1, 정종암 시집 ‘내가 사는 이 좋은 세상에(부제; 쪽방촌의 밤)’)에서 읊어졌다. 맞다. 그 주검의 빈자리가 또 채워지는 이 사회가 슬프다. 시적화자는 이러한 화재참사를 예견한 것일까.
이 시가 나온 때에는 이명박 정부이나,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란 이 정부의 슬로건이 야속할 뿐이다. 자기들만이 촛불을 든 양, 승자독식의 포만감에 취약계층을 돌볼 틈이 없는 모양이다. 그때나 이때나 변함없는 가증스러움만 더한다. 좌파와 우파를 넘어 승자독식정치(winner-take-all politics)의 폐해는 끝이 없다.
포용의 정치가 실종된 한국판 거대양당정치는 말로만 복지를 외칠 뿐, 자신의 지역 예산편성에만 혈안이다. 여기에다 “정부 돈 먼저 본 자가 임자다”는 심리가 사회 구석구석에 팽배해 있다. 정책입안자나 공무원들의 혈세누수도 많다. 이 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누수분만 막아도 복지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나, 도덕불감증의 만연으로 공존의 늪이 없다.
경제적 엘리트만의 이익에만 치중할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 대 반민주, 좌와 우의 대립의 시대는 지났다. 진정한 복지국가, 정의사회가 되어야함이다. 불평등과 평등을 주장함은 비현실적인 사안이 아니다. 불평등한 사회, 복지사각지대에서의 이러한 참사가 다시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위정자는 백성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는 것을 걱정하라”고 설파했다. 이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태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