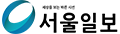인권업무를 맡고 여유로웠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뭐 쫒기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부산스럽게 이걸 해야 하나 저걸 해야 하나 노트는 온통 연필이 지나간 자국으로 가득하고 인권담당이니 뭔가 큰 프로젝트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머릿속은 온통 복잡하기까지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가지도 않았던 서점과 도서관까지 다니며 머릿속에 절반은 애 키우는 엄마이기 이전에 인권담당자라는 이름이 조심스레 날 따라다녔다.
‘잘하고 싶다.’
욕심같이 보일 수 있지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방향을 잘못 잡고 혼자 헤매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쯤.
아들이 나에게 수학문제를 질문했다.
그러나 문제집을 본 순간 지렁이인지 낙서인지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보며 “발로 쓴거야??”소리 지른 후 “천천히 다시 풀어봐!!”라고 소리쳤다.
아들은 “엄마 이 정도면 다 알아본다구요?” 짜증을 부렸지만 이내 엄마 고집은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십 여분이 지났을까!! 아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방을 나왔다. “엄마 어디서 실수했는지 찾았어요. 제가 글씨를 엉망으로 써놔서 찾지 못했던 거예요!! 나머지 문제도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풀어볼게요”했다.
“거봐, 처음부터 천천히 하면 어려울 게 없잖아” 얘기하고 뿌듯해 하던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처음”
그래. 처음이었다. 첫 여행, 첫 수업, 첫 키스처럼 무언가 시작을 할 때 붙여지는 설렘을 나타내는 묘한 단어.
‘그래 처음이었지!!’ 나 또한 25년 경찰서 근무하며 그 처음을 떠올려본다.
경찰서에 처음 발령받은 첫날.
7급으로 처음 승진 했던 그날.
인권업무를 맡았던 첫 날.
생각해보니 매순간 나에게는 처음이라는 단어가 쫒아 다녔다. 능력도 없으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니 나를 모르던 직원들도 “열심히 한다”며 인정해주고, 잦은 실수에도 “다음에는 더 잘할 것이다”라며 격려해주신 직원들이 내 주위에는 무수히 많았던 날들이 또 불현 듯 떠올랐다. 처음이지만 그 처음을 함께했던 직원들.
‘인권’ 모두가 처음이었다. 인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민들을 도와줘야 하는지 어색하고 처음인 경찰들과 인권의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하는 시민들 모두 처음이라는 인권 앞에 갈팡질팡하며 뭔가 대단한 게 필요한건 아닌지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거다. 하지만 인권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보호해주며 서로 처음이라는 마음 그대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 되는 거였다
누군가는 말한다. 인권은 그리 쉬운 단어가 아니라고.
또 누군가는 말한다. 인권이라는 어색한 처음을 눈높이 맞춰 함께 변화한다면 인권회복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의 설렘을 기억하자.
경찰들이 시민을 위해 처음 달렸던 그날을 기억하자. 달리다 보면 그 끝은 인권침해의 차별이 사라지는 종착역이지 않을까? 처음이란 소중한 단어를 잊지말고 기억해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 그 마음 그대로 힘차게 달려가는 인권경찰이 되길 기대하며 오늘도 시민과 경찰은 같은 곳 같은 꿈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