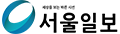구석구석 코리아-100대 명산 '팔봉산'
강원 홍천강 따라 솟은 '팔봉산'을 가다
공룡의 등뼈 타고 오르내리듯 우뚝 솟은 팔봉
(조경렬 기자) 신록의 계절이다. 봄의 언저리에서 피어난 진달래 개나리가 지고, 그 자리에 연록색의 향연, 신록이 짙어가고 있다. 연초록으로 피어난 신록은 아기의 고사리 손처럼 앳되게 피어나 점점 짙어지는 햇살 만큼씩 잎사귀도 초록으로 짙어간다.
온 산이 수수롭게 피어난 신록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정갈해 지고, 유년시절 추억의 실타래를 마구 풀어내는 환상에 젖는다. 누구나 유년 시절의 추억은 있으니까. 오늘은 이런 신록의 아름다운 자태를 만나러 팔봉산으로 떠나 본다.

한반도 우리 산하山河 어디를 간들 아름답지 않는 산이 있으랴만 오월의 산을 꼽으라면 강원도 홍천 팔봉산(327m)을 추천하고 싶다.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팔봉산은 여덟 개의 봉우리가 옹기종기 산세를 이루고 있다하여 팔봉산이라 이름 붙여졌다.
1980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여덟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명산으로 팔봉산은 제일 높은 봉우리가 정상석이 있는 3봉(309m)이 아니라 당집이 있는 2봉(327m)이 가장 높다.
흔히 팔봉산은 산을 즐겨 찾는 산꾼들에게는 적어도 두 번 놀라게 하는 산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비록 낮은 산이지만 산세가 아름다워 놀라고, 일단 산에 올라보면 암릉이 줄지어 있어 산행이 만만치 않아 놀란다.

신록이 짙어가는 오월 산행
수려한 경관과 유유한 강물이 있어 팔봉산은 봄 가을에는 등산객이, 여름에는 피서객이 많이 찾는다. 산행지 입구의 주차장에서 보면 팔봉교가 보인다. 이 다리를 건너 매표소에서부터 산행을 시작해 1봉부터 차례로 8봉까지 올랐다가 오른쪽 급경사 길로 내려오는 코스가 좋다.
팔봉산은 8개 봉우리가 모두 암봉이다. 봉우리를 오르내리지만 초보자도 주의만 하면 무난히 암봉과 암릉의 바위 맛을 즐길 수 있다. 1~2봉과 4봉은 우회코스가 있고, 2봉과 3봉 사이, 8봉 직전에 하산 코스가 있다. 8봉이 가장 험한데 암벽에 약한 사람은 8봉 직전에서 하산 하는 게 좋다.
이 팔봉산을 감싸고 도는 홍천강 유역은 여름철 피서지로도 그만이지만 산행 후 물놀이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홍천강과 잘 어우러져 풍치가 아름다운 산으로 작은 여덟 봉우리가 서로 팔짱을 낀 8형제처럼 한 줄로 이어진 자태가 참 의젓해 보인다.
초여름 날씨가 제법 덥다. 필자는 제1봉을 향하여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얼마를 오르지 못해 모두들 재킷을 벗어 제친다. 20여 분을 올랐다. 이마에 땀이 나기 시작한다. 이럴 땐 시원한 수박이 갈증해소에 제격이다. 어느새 한 친구가 큼직한 수박 케이스를 풀어 놓는다. 어젯밤 사각형으로 썰어 내장실에 넣었다가 가져 온 것이란다. 시원하고 향긋한 과육 맛이 그만이다.

제1봉을 지나 암릉을 내려가는 코스가 나왔다. 저 건너가 제2봉이다. 정상으로 오르면 작은 당우가 나타난다. 삼부인당三婦人堂이라는 당집이 덩그러니 앞을 막는다. 이 당집은 평소에는 굳게 잠겨 있어서 안쪽을 들여다 볼 수가 없다. 여기 당집은 지역 주민들의 안녕을 빌고 액厄을 막아 준다는 서낭당이다.
여기에는 삼부인 설화가 내려오는데 풍년과 흉년을 주재하는 이씨, 김씨, 홍씨 세 여신인 삼부인三婦人을 모시고 있다. 해마다 년 초에 당굿을 할 때, 마음씨 좋은 이씨와 김씨 신神이 강림하면 풍년이 들지만, 홍씨 신이 내리면 흉년이 든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다.
이곳 홍천 서면 팔봉리에서는 해마다 음력 3월과 9월 보름에 팔봉산 당집에 삼부인신과 칠성신령七星神靈을 모셔 와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비는 당굿을 지낸다고 한다.
이 당집은 '서낭당'이라고도 하는데, 서낭의 유래는 한국 전래의 천신天神과 산신山神이 복합된 민간신앙이다. 여기에 중국에서 유입된 성황신앙城隍信仰이 융합되어 성황당이라고도 했다.
이 서낭당은 지역 간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마을수호, 액운퇴치, 소원성취 등을 기원하는 옛날 민간종교로서의 의미가 있다. 여행 중 시골 마을 어귀를 가다 보면 간혹 작은 당집이 보인다. 우리 전통이 숨어 있다는 생각에 반가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신비감에 젖기도 하는 공간이다.

해산굴을 빠져나가면 무병장수 한다는 전설
이처럼 이 작은 산에도 당집이 있고 전설이 암릉에 녹아 있다. 4봉 직전에 통과해야 하는 '해산굴'이라는 재미있는 코스가 있는데, 이곳은 사람이 겨우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뚫린 작은 바위 구멍으로, 몸집이 작은 사람이라도 빠져 나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 때 먼저 빠져나간 선행자가 배낭을 받아주고 손을 잡아 주어야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 이곳을 빠져나가기가 ‘아이를 낳는 것’ 만큼이나 힘들다 하여 해산굴이란 이름 붙여졌다. 이 해산굴 표지판에 적힌 해산굴 설명이 재미나다.
태고의 신비를 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굴은 통과하는 과정의 힘듦이 아이를 낳는 고통을 느낀다하여 해산굴이라 부른다고 적고 있다. 이 굴을 빠져 나가면 무병장수 한다는 전설이 있어 일명 '장수굴'이라고도 한다.
팔봉산은 주능선이 마치 병풍을 펼친듯 한 산세로 예부터 '소금강'이라 불리어질 만큼 아름답다. 게다가 주능선 우측에서 좌측으로 유유히 흐르는 홍천강의 유려한 곡류천曲流川의 풍광이 이어져 아름다움을 더한다. 이런 곡류천을 사행천蛇行川 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행천은 영월 동강과 낙동강 하구다.
이 사행천은 마치 뱀이 기어가는 모습처럼 구불구불한 형태로 흐르는 강을 의미한다. 하천의 곡류는 충적평야에서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곡류하는 자유 곡류와 산지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곡류하는 감입곡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홍천강의 곡류는 협곡을 휘감아 도는 감입곡류이다.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정상 산릉에서 바라보는 산하山河와 평야는 그야말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생생한 파노라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 바라보는 전망은 더없이 아름답다.
그다지 높지 않은 나지막한 산 이지만 섬세함이 있고, 오밀조밀한 암릉이 있어 산행이 만만치 않다. 홍천강이 산기슭을 적시며 휘감아 돌아 풍치 또한 큰 산의 웅장함에 못지않다.
더욱이 숲 사이로 뾰족뾰족 솟은 적벽과 기암괴석이 굽이굽이 감도는 홍천강의 맑은 물줄기와 어울려 한 폭의 동양화를 감상하는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산꾼들은 말한다, 팔봉산은 작지만 아름다운 산이라고.
느긋한 몸짓으로 카메라에 홍천강의 물굽이를 담고, 기암괴석을 즐기면서 산행을 해도 4~5시간 이면 족하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쌓여 있을 때는 위험하다. 여름 장마철 홍천강 물이 불어나면 하산코스인 강변 등산로가 물에 잠기어 통제되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떠나야 한다.

그리 높지 않아도 아름다운 팔봉산, 발아래 굽어보이는 홍천강의 유유함에 혼을 뺏긴 사이 일행이 저 만큼 앞서 가고 있다. 오르락내리락 암릉을 타고 도는 재미가 그만이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산이 바로 팔봉산이다. 암릉 산행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우회를 하면 된다. 그래도 강물은 팔봉을 감아 돌고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으니까.
간간이 보이는 들꽃의 생기에 취하고 바람에 취하고 산새의 지저귐에 신비감을 느껴 보라. 이게 초여름 산행에서 느끼는 우아함이다. 산은 언제나 그 곳에 있다. 다만 인간이 찾아가 그의 어깨에 기대고 가슴에 안기고 팔을 베고 눕는다. 그래도 언제나 포근하게 인간에게 길을 내어주고 받아 주는 게 산이다. 그래서 산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