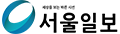(전략)어찌타 북(北)녘 땅은 핏빛으로 물들었나?(후략)
이 대사(臺詞)는1960~70년대 KBS제1라디오 정오뉴스 5분전에 했던 김삿갓 북한방랑기라는 5분 드라마 대사중의 일부다.
이대사가 생각나는 것은 최근 들어 도처(到處)에서 일고 있는 기자회견으로 물든 정치인들을 보노라니 생각이 난다. 안양도 예외가 아니다. 어찌타 안양 땅은 회견(會見)빛으로 물들었나?
웃어야 할까? 울어야할까? 좋은 것인가 나뿐 것인가? 우둔(愚鈍)한 필자는 알 수가 없다. 하늘을 나는 봉황(鳳凰)의 뜻을 처마 밑을 벗어나지 못하는 연작(燕雀)들이 어찌 알 수 있을까?참으로 세상사는 어지럽고 답답하다.
바야흐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다. 북풍한설(北風寒雪)이 내리는 혹한(酷寒)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킨 만산수목(樹木)들의 생동감(生動感)은 우리에게 희망(希望)과 용기(勇氣)를 주는 봄철이다.
뿐이랴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은 다언(多言)을 생산하는 선거(選擧)철이기도 하다.
말(言)의 잔치이자 호언(豪言)의 올림픽인6.13선거가 발밑에 와있다. 선거철을 맞은 도처(到處)의 정치인들은 모인물속의 망 둥 어처럼 서로 치고 받는 망동(妄動)함을 보인다. 이유가 무엇일까? 네가 낙선(落選)해야 내가 당선(當選)하고. 너의 불행(不幸)이 나의 행복(幸福)이고 가문(家門)의 영광(榮光)이자 나의 영달(榮達)이라는 등식(等式) 때문이다.
그래서 수년 동안 잠잠했던 상대의 비리(非理)와 약점(弱點)을 들고 나와 목청을 높인다. 교체채용이 어떻고. 이런 저런 의혹(疑惑)이 있으니 밝히라는 등 민초(民草)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원칙과 양심(良心)과 청렴(淸廉)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인데 어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을까? 명경지수(明鏡止水)같이 깨끗하다고 했던 그들이 어찌 이런 의혹들이 있을까? 구우일모(九牛一毛)의 부정비리와 농단(壟斷)이 없는 양심적(良心的)이고 청렴(淸廉)하다고 말한 그들이었다.
오매불망(寤寐不忘) 주민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부를 받친다고 했던 그들이었다. 평상시의 호형호제(呼兄呼弟)했던 모습들은 오간 데 없고 웃음 속에 숨겼던 비수(匕首)만 보이는 것 같다.
인심(人心)은 곳간에서 얻고 약점(弱點)은 친(親)한데서 얻는 다고했던가? 못 믿을 것이 인심인 것 같다. 야산의 꽃들은 만발해 웃는데 도처의 인심은 흉흉(兇凶)하니 이 세상 믿을 것이 없다.
오호애재(嗚呼哀哉)로다. 우리는 지금 피 할 수 없는 선거의 홍수(洪水)속에 기자회견(記者會見)이라는 부유물(浮遊物)을 보고 있다. 기자들을 모이게 하는 거창한 이름의 회견은 중앙보다는 지방이 많다.
평소에는 대부분 사이비기자(似而非記者)나 사이비언론으로 취급해 편 갈라 무시했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보니 회견(會見)은 불신 속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안양은 시장에 출마한 더불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회견이 주를 이룬다. 자유 한국 당은 현직인 이필운 시장의 출마가 확실시한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최대호, 임채호, 이정국, 김삼용 예비후보들이 당내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자를 모이게 하는 호루라기는 최대호 임채호 이정국 예비후보들이 교대로 불고 있다. 서로가 질세라. 마치 장군 멍군하는 장기판(將棋板)의 형국이다.
최근에는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도 호루라기를 불었다. 손소장의 호루라기는 그동안 최대호 예비후보에 제기됐던 이런 저런 의혹 외에 친인척의 인사의혹을 제기했다.
최 예비후보는 양심과 인격을 걸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최대호가 펴낸 안양혁신보고서라는 책의 제목과 부합(符合)된다. 필자는 최대호 예비후보와 손영태 소장과는 사사로운 교감(交感)이 없다보니 모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정치인 최대호 의 정치적 양심과 손영태의 용기는 믿고 싶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고 있는 일연의 의혹들을 해명해야한다.
특히 손소장이 제기한 인사의혹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그래서 문과식비(文過飾非=허물을 꾸미고 잘못을 변명)의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난6일 박근혜의 재판결과를 카 톡으로 알렸듯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혀야한다. 두고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