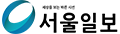건설현장은 그동안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사업장으로 인식돼 왔다. 그렇다 보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조업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 5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발표한 걸 보니 중국발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건설현장의 경우 미세먼지 주범에서 벗어난 셈이다. 애꿎은 공사현장만 누명을 쓴 꼴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하루만 공사가 단축돼도 3∼4일 정도의 영향을 준다. 건설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산먼지와 고농도 미세먼지를 구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체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정부에서 중점 관리하는 미세먼지로 볼 수 없다.
비산먼지의 경우 세륜 시설이나 살수, 방진막 등으로 현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건 건설기계나 건설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비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현장 작업자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조업단축 때 비용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다. 공사가 늦어지면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이어진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정부가 조업단축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 보전 등 세밀한 정책 설계가 따라야 한다.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건설 부문의 경우 기계장비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야 한다.
특히 비도로용 건설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미세먼지와 관련된 배출가스등의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비도로용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잇는 추세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제작 단계뿐 아니라 운용 단계에서도 노후화된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진단이 제대로 돼야 좋은 처방이 나온다.
미세먼지 대책도 애꿋은 건설현장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 등 근본대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