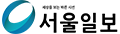예부터 충정과 간사스러움에는 뚜렷한 구별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제갈량(諸葛亮)은 충신이고 조조(曹操)는 간신이었다는 견해에 대해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조조는 간신 동탁(董卓)을 토벌하면서 군사를 일으켰지만, 이는 사실 ‘간사함으로 간사함을 대신하는’일이었다. 동탁을 제거한 후 조조는 정권을 농락하면서 황제를 무시하고 군신들을 억압했다. 그의 간사함은 동탁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았다.
게다가 그의 아들 조비(曹丕)가 스스로 황제가 됨으로써 위(魏)로 한(漢) 왕조를 대체하고 조조를 위 무제로 내몰았던 일은 아비의 간사함을 대물림한 행태였다.
한편 제갈량은 대단한 충신이었고 그의 주군인 유비(劉備)는 한(漢) 황실의 종친으로써 인덕 있고 너그럽고 후한 인물이라 천하의 인심이 그에게 돌아갔다.
조비가 칭제한 후에 유비도 촉한의 황제가 되어 엄연한 한 황실의 계승자임을 자처 했다. 유비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한 왕조에 충성하는 것이었던 만큼 어느 모로 보나 제갈량이 충신이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인간의 사유는 때로 아주 이상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조조가 한나라 황실에 충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간신으로 규정한다면 상(商)의 탕왕(湯王)이 하(夏)에 반역했던 것도 간신의 소치였단 말인가?
주(周) 무왕(武王)이 은(殷)을 멸한 것과 당(唐) 고조(高祖) 이연(李淵)이 수(隋)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것, 그리고 송(宋) 태조 조광윤(趙匡胤)이 병변을 일으켜 후주(後周)의 ‘과부 정권’을 탈취한 것도 간신의 소치란 말인가?
구(舊)정권이 부패하면 왕조가 교체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로서 군주의 주살과 신하들의 모반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맹자는 주 무왕이 은의 주왕(紂王)을 죽인 것에 대해 “주라는 사내를 죽였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맹자는 은의 주왕을 정상적인 군주가 아닌 잔인하고 포악한 백성의 적으로 간주하여 신하들이 그를 죽인 것은 사람을 죽인 죄일 뿐 반역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맹자의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천하는 원래 주인이 없다. 덕이 있는 사람이 이를 차지하는 것이다. 조조는 역대의 사서나 문학작품에서 항상 간사한 술수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부덕한 인물로 묘사되어 왔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조가 그토록 덕이 없는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그의 수하에 무수한 모사와 맹장들이 모여들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인덕과 의기가 부족한 사람이 천하의 영웅들을 자신의 주변에 끌어 모을 수 있었다면 이들을 어찌 영웅이라 할 수 있겠는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자면 조조가 덕이 없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술수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인재 활용에 있어서 조조와 제갈량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제갈량이 문치와 무공에 있어서 조조를 월등하게 능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조의 수하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던 반면 제갈량에게는 쓸 만한 인재가 없었다.
제갈량은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처리했고 모든 전투에 직접 나갔으며 스스로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패전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제갈량의 수하를 지킨 것은 이른바 오호대장(五虎大將-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을 지칭함)들뿐이었다. 반면에 조조의 수하에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장수들이 수십 명에 달했다.
제갈량의 후계자로 강유(姜維)가 있었지만 그는 위(魏)에서 투항한 장수였기 때문에 그의 수하에는 더더욱 인재가 없었다. 때문에 제갈량은 홀로 고군분투했지만 독장난명(獨掌難鳴)의 상황에서 손발이 묶였고, 그 결과 패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조조의 인재 관리는 제갈량에 비해 매우 대조적이었다. 그의 후계자였던 사마의(司馬懿)는 지략에 있어서도 조조나 제갈량에 뒤지지 않아 마침내 촉(蜀)을 멸망시키고 오(吳)를 병탄하여 중원을 통일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 인재 관리에 있어선 제갈량이 조조에 훨씬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