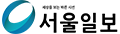우리 생활 주변 건물에는 어김없이 병원이 한 개 이상 입점해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과거보다 많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는 한데, 막상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망설일 때가 적지 않다.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인가? 몇 년 전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환자가 생각하는 좋은 병원이란 어떤 병원인가?'에 대하여 주제별로 발표한 적이 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환자가 생각하는 좋은 병원이란 환자가 필요시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정확한 진료를 통해 믿음과 신뢰로 질병에서 해방되고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과 시스템을 갖춘 좋은 환경의 병원이라 했다.
이어서 좋은 병원을 선택할 때 국내에서는 실력/친절/좋은 시설/용이성과 시설이 좋은 병원보다는 친절한 병원이 좋다고 하였다.
가까운 일본의 닛케이비즈니스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80.9%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들었다. 미국 경우는 좋은 병원 선택의 기준에서 진료 성과(실력 이외의)를 제외하고는 존엄성, 신속한 응대, 내 집 같은 편안함, 이해하기 쉬운 설명, 심리적 안정 부분을 들었다. 즉 인간다운 대우와 관심을 원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열린 '보건의료의 신뢰 문제와 건강 정보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가 흥미롭다.
GFK Verein의 국제의료 신뢰도 비교 연구를 인용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사를 일반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75%로 27개국 중 24번째로 하위권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사 및 의료진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의사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것을 신뢰 저하의 원인으로 생각했다. 의사와 양질의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양질의 의료로 생각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 고통에 집중하는데 반해 의사들은 그 원인인 질병에 대한 진단에만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진료를 하는 경향이 있다. 환자들의 진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 환자의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의료진의 답답함은 따로 있다. 미국과 호주는 환자 질병에 따라 의사의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에 따라 수가를 책정해 양질의 진료를 정책적으로 담보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수가 체계에서는 3분을 진료해도, 30분을 진료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다고 법과 제도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의료인에게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병원 업무를 보는 것 이상의 더 특별하고 고귀한 역할이 있다.
친절과 사랑을 통해서 모든 환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기쁨을 주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좋은 병원이 되기 위해서 보탬이 될 수는 있지만, 안 좋은 병원이 되는 데는 확실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대할 때 마다 '환자입장에서 생각해 봤어?'를 자문하며 노력해 나아갈 때 좋은 병원에 대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본다.